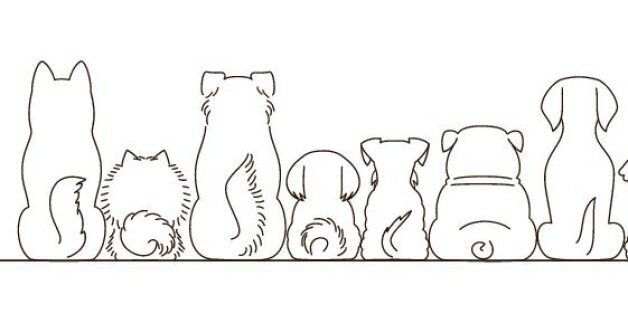
여러 해 전 국내 여행길에서의 일이다. 동행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저런 메뉴들을 주문한 뒤 나는 라면 코너에 서서 멍하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개의 라면 주문이 들어갔고 1인분짜리 자그마한 양은 냄비들이 커다란 가스레인지 위에 착착 놓였다. 꽤 인기 코너인 그곳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저씨와 할아버지의 중간쯤 되어 보이는 분 하나밖에 없었다. 흰색 조리가운에 흰색 조리모자 밑으로는 성성한 흰머리가 보였으며 몸은 마른 편이고 입매가 야무진 분이었다.
기이하게도 나는 점점 그분이 라면 끓이는 동작에 빠져들어갔다. 당연하게도 라면은 놓인 순서에 따라 제각각 익는 속도가 달랐는데 그 모든 제조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팔 길이만큼 길다란 국자로 물을 떠서 각각의 냄비에 따르는 동작, 스프와 콩나물을 넣는 동작, 다 익은 면을 집게로 집어 그릇에 던 뒤 국물을 따르는 동작, 사이사이 새로운 냄비를 올려놓고 조리도구를 깨끗이 닦는 동작... 그 모든 동작 사이에는 한 치의 머뭇거림도 분주함도 소홀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비슷한 작업을 오래도록 반복한 사람 특유의 낭비 없는 동작을 지켜보기를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이분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모든 동작이 조용하고, 우아했다. 그 특별함은 기품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는 발레를 곧잘 보는 편인데, 고도의 훈련을 통해 온몸을 정확히 제어하는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동작에서 굉장한 쾌감을 느낀다. 라면 끓이던 분에게서 내가 느낀 쾌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적 동작과는 판이하게 다른 어떤 몸짓에 깃든 기품.
또 다른 장면을 기억한다. 십여 년쯤 전 친구와 함께 키우던 천방지축 닥스훈트 '닥훈이'를 데리고 애견 카페에 갔다. 널찍한 공간에 풀어놓은 개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그 옆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있었다. 우리도 차를 시켜놓고 평소 보기 힘든 광경인 '개떼'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개들이 낯선 공간에서 서로 얽히다 보니 영역 표시라든가 긴장해서라든가 하는 다양한 이유로 배변 활동이 잦았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옆에서 개들은 똥오줌을 싸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신기했다. 지켜봤더니 개들이 배변을 하면 여러 직원들이 바로 달려와서 처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중 눈에 띄게 동작이 달랐던 한 직원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십대쯤의 청년이었다. 우리가 앉은 근처에서 한 강아지가 쉬를 했다. 그 청년은 저 끝에서부터 순식간에 다가오더니 스폰지 밀대로 일단 그것을 훔쳤다. 그런 뒤 무릎을 굽히고 노련한 보안관처럼 등 뒤에 꽂힌 두 가지 스프레이 중 하나를 뽑아 칙칙, 뿌린 후 허리춤에 꽂힌 두루마리 휴지를 뽑아 긴 팔로 들어올렸다.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휴지봉에 꽂고 왼손으로는 휴지 끝을 잡더니 허공에서 휘휘 돌려 풀려나오는 것을 유려하게 감아 쥐고 바닥을 닦았다. 무슨 리본 체조 같았다. 연속 동작으로 등 뒤에서 다른 소취제를 뽑아 칙칙, 뿌린 후 정확히 같은 리본 체조를 반복하더니 사뿐히 일어나 가버렸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났던지! 앞서 라면을 끓이던 분의 동작이 발레와 같았다면 이 청년의 동작은 투우사의 몸짓 같았달까. 청년의 동작에도 분명한 '기품'이 있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남들 밥 먹는 옆에서 그들이 데려온 개 똥오줌을 치우는 일은 '기품'과는 가장 거리가 멀게 느껴질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니 바로 그러기에 그 청년의 기품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낸 것이어서 더욱 눈부셨다. 포정해우(庖丁解牛), 장자에 나오는 말이 떠오른다. 포정이 칼로 소를 바르는 모든 동작이 음률에 맞는 것을 보고 문혜군이 탄복하여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道)이니 손끝의 재주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 보이는 것은 오로지 소뿐이어서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니, 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의 작용이 멎으니 자연스럽게 정신만 남았습니다. 천리를 따라 가죽과 고기, 뼈와 뼈 사이로 칼을 놀리고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해나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처지에서든, 나도 나의 일에 눈이 아닌 정신을 다하여 기품을 기르는 생활을 하고 싶다.
* 이 글은 월간에세이(2016년 10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