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장 공포스런 대목은 피해 규모의 불확실성이다. 1994년 당시 유공(현재 에스케이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시판이 중단되기까지 해당 제품을 쓴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숨져갔는지 알 수 없다. 사건 발생 뒤 5년 동안 피해 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해 온 최예용(51)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일과 3일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의 만남과 이후 전화로 이뤄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써 피해를 입은 이들은 최소 29만명에서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를 신고한 이는 1528명으로, 최소치의 1%도 안 된다. 피해자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 규모 추산의 근거는 이렇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국민의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당시 한국 인구가 4941만명이니 사용자는 894만명에 해당한다. 문제의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실험 때 60번 가운데 2번은 독성 성분이 고농도로 측정됐다. 894만명의 60분의 2는 29만명에 해당한다.
227만명도 부풀려진 수치가 아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지난해 12월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1087만명)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20.9%(227만명)는 건강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한 지난달부터 환경보건시민센터에는 하루에 100건이 넘는 피해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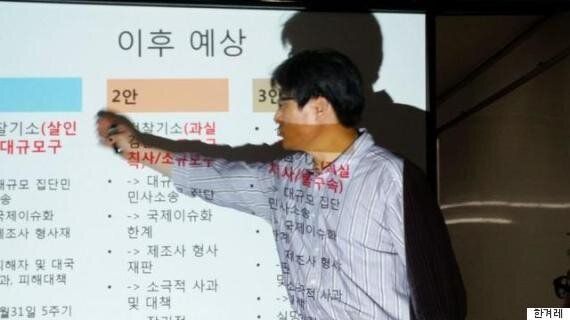
최 소장이 보기에 한국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첫 번째 기회는 1994년 유공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개발했을 때다. 이때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두 번째 기회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한 옥시 쪽이 2001년 제품 성분을 문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으로 바꿀 때다. 이때도 역시 인체 유해성을 따져봤어야 했다. 세 번째는 2006∼2007년이다. 서울 시내 소아과에 어린이들이 호흡 곤란 증세로 실려와 제대로 된 처치도 받지 못하고 숨져가던 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관련 조사만 한 뒤 “연관성 없다”고 하지 않고 화학약품 관련성을 의심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네 번째 기회도 있었다. 2011년 8월31일 정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다. 이때라도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뭔지 밝혔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유해성 평가 용역을 맡은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이 제대로 된 결과를 냈다면, 2012년 피해자들이 옥시 등 업체 쪽을 고소했을 때 검찰과 경찰이 팔짱만 끼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신속하게 했더라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을 터다.
그래서 고소 뒤 3년 넘게 미적거리다 이제야 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보를 바라보는 최 소장의 눈엔 불안이 가득하다. 그는 “수사를 미적거리는 동안 피해자의 30% 이상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역시 가습기살균 제품을 판매한 애경그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폐 이외 부위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않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드러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함께 국가의 존재 의의에 또 다른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존재 의의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한국의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냐. 세월호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안방의 세월호’라는 말은 결코 레토릭(수사)이 아니다."
최 소장은 한겨레신문사와 동갑내기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이 1988년 만들어진 때부터 1994년 환경운동연합 상근자를 거쳐 2010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으로 일했다. 이듬해 터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붙들고 사람들의 무덤덤한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5년 넘게 끈질기게 싸워 왔다. 그는 요즘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모임(가피모)’과 함께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는 물론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최 소장은 피해 가족들과 함께 유해성이 확인된 10개 제품 제조·판매회사 19곳의 전·현직 임직원 256명을 지금까지 고소·고발하고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옥시 제품 불매운동 등을 벌여 왔다. 최 소장은 4일 영국 런던으로 떠난다.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의 주주총회가 한국의 어린이날인 5일 열리기 때문이다. 꼭 1년 전에도 런던의 레킷벤키저 본사를 항의방문한 바 있는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숨진 김승준군의 아빠 김덕종씨 등과 함께 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의 부도덕함을 알리는 한편 본사 임원들을 런던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최 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다국적 기업의 ‘의도적 이중기준’ 문제도 제기할 생각이다. “유럽은 이미 1998년에 기업이 바이오사이드(살생성분) 제품을 판매하려면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토록 했는데, 한국엔 그런 게 없다. 레킷벤키저가 2001년 옥시를 인수할 당시 영국 본사와는 다른 이중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유럽에선 옥시의 뉴가습기당번같은 제품을 팔 수 없는 것이다.”
최 소장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 한국 사회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묻자 의외로 소박한 대답을 내놨다. “거창한 얘긴 필요 없어요. 제발 스프레이 제품 쓰지 마세요. 이게 공기에 살포되는 제품들이잖아요. 사용자가 호흡기로 마신다는 얘기에요. 근데 스프레이 제품 중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가습기살균제가 터진 5년 동안 유사한 피해를 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조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