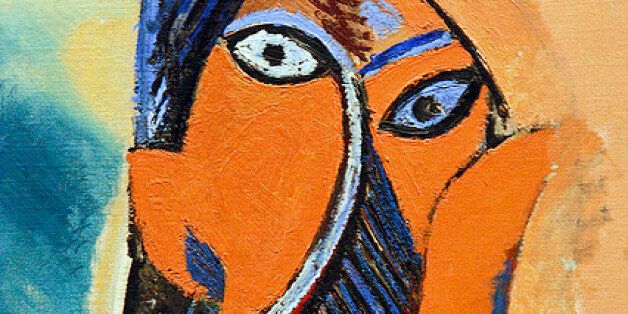
예술가를 예술가로 만드는 힘은 좋게 말하면 ‘집념’, 대놓고 말하면 ‘광기’일 것이다. 광기 어린 예술가들 가운데 움직임의 아름다움에 유독 집착했던 이들이 있다.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사물의 움직임을 작품 소재로 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진화하는 생명체까지 만들어냈다. 평생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던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알렉산더 칼더, 기존의 예술 작풍을 일거에 뒤집어엎은 마르셀 뒤샹, 4만 5,000여 작품 수만큼 여성에게도 탐닉했던 피카소와 미친 사람처럼 물감을 뿌려대던 잭슨 폴록이 그 주인공들. 100년에 걸친 이 드라마의 종결자는 ‘21세기 다빈치’로 불린 테오 얀센이다. 왜 그들은 움직임에 집착했을까. 당신이 몰랐던, 예술가들이 움직임에 집착했던 이유를 알아보자.
1. 얀센은 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를 만들었을까
물리학을 전공한 테오 얀센(Theo Yansen)이 주목한 것은 벌레였다. 한 번도 지구의 지배자였던 적 없지만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멈추지 않은 작은 생명체, 그 몸에 새겨진 시간의 축적을 공간 속의 움직임으로 바꾸고자 했다. 바람의 힘만으로 수백 개 관절을 움직이며 이동하는 기계생물체, ‘해변의 괴물(Strandbeest)’이 1990년부터 네덜란드 바닷가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은 현대 문명의 부산물인 노란 플라스틱 튜브와 나일론 끈, 페트병과 고무링이었다. 특정 종의 진화 과정을 압축해 보여주는 개체 발생처럼 이들도 얀센의 손을 거쳐, 접착테이프를 이용한 초기의 끈끈이 생물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뇌 생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얀센은 ‘예술과 공학 사이의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의 실험은 이 생명체들이 무한에너지인 바람을 자양분 삼아,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스스로의 삶을 살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얀센이 움직임 그 자체를 생물체로 만들기 전까지, 서양 회화는 3차원 현실을 2차원 화폭에 충실히 재현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았다. 20세기 초 몬드리안은 기하학적 추상을 회화에 도입하면서 그 도도한 전통을 거슬렀다.
2. 몬드리안은 왜 대각선을 싫어했을까

인간과 자연 또는 신과 인간을 상징하는 수직과 수평선은 몬드리안에게 신앙과도 같았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색을 품은 네모들로 구성된 작품이다. 풍경 화가로 출발한 몬드리안(Piet Mondrian)이 신조형주의를 주창한 것은, 1917년 잡지 <데 슈틸>(De Stijl)을 발행하면서이다. 그때 함께한 열 살 아래 동지가 두스뷔르흐(Theo van Doesburg). 그들은 최소한의 기본요소로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색채는 빨-노-파 3원색과 흰색-회색-검은색을, 선은 수직-수평선만을 고집했다. 그렇지만 몬드리안처럼 곡선과 사선을 배격했던 두스뷔르흐는 채 10년이 지나기 전에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두스뷔르흐는 세계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선은 대각선이며, 현대회화는 반드시 사선 구도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각이 바뀌자 작품도 바뀌었다. 몬드리안은 여전히 수직과 수평선만을 고집했다. 선의 기울기에 대한 차이는 작은 듯 보이지만 화해 불가능한 철학의 차이, 신념의 차이였다. 결국 둘은 헤어졌다.
캔버스를 돌려서 그릴지언정, 사선 구도를 채택하지 않았던 몬드리안의 신념은 역설적으로 그를 따랐던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에 의해 허물어진다.
3. 칼더는 왜 몬드리안의 작품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어린 칼더는 늘 손으로 무엇이든 만들었다. 마음대로 휘고 접을 수 있는, 더구나 값도 싼 철사는 그의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칼더가 예술가가 된 것도 뛰어난 손재주 덕분이었다. 1927년 칼더는 철사·나뭇조각·종이로 동물과 서커스 단원을 만들어 자기 스튜디오에서 모형 공연을 펼쳤다. 폭소를 터뜨리며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던 관객 중에 몬드리안도 있었다. 칼더는 그를 존경했다. 몬드리안이 즐겨 쓴 삼원색이 칼더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칼더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었다. 평면의 선과 면을 공간으로 옮겨 자유로운 드로잉을 연출하고 싶었다. 두스뷔르흐보다 수직과 수평을 더 소중히 여겼던 고집쟁이 몬드리안을 마침내 허공에 매달아버렸다.
공간 속의 움직임이 잉태한 우연성과 즉흥성, 그리고 시간과 결합한 연속성은 현대 조각의 개념을 바꾼 20세기 최고의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칼더의 움직이는 조각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덕분에 이름을 얻게 된다.
4. 뒤샹의 누드화는 왜 대중의 비난을 샀을까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1917년은 예술계에서도 혁명의 해였다. 그해 4월 뒤샹은 뉴욕 공중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남성용 변기를 <샘 Fountain>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장에 버젓이 내놓았고, 동료 예술가들은 경악했다. 공장에서 생산한 기성품, 레디메이드(ready-made)는 예술품이 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과연 예술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것이다. 의자 위에 바퀴 한쪽을 올려놓은 작품 <자전거 바퀴>에서 알 수 있듯, 뒤샹은 사물의 움직임에도 주목한 작가였다. 칼더가 기계장치를 사용해 만든, 최초의 움직이는 조각을 ‘모빌(mobile)’이라고 부른 것도 그였다.

뒤샹은 1913년 뉴욕 제69연대 병기창에서 열린 아모리쇼(Armory Show)에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출품했고, 작품을 접한 대중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아름다운 여인의 누드가 아니라 기계처럼 차갑고 무감각한 존재, 해체되고 파편화한 이미지가 주는 시각적 충격 때문이었다. 멈춘 듯 걷고 걷는 듯 멈추어 선, 인체 운동을 순간과 연속으로 포착한 이 작품은 19세기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에 버금가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 회화 양식을 거부하고 2차원 화폭에 운동성과 속도감을 담아낸 뒤샹의 작품은 언 땅에 때 이르게 찾아온 한 마리 제비였다.
3차원 운동을 2차원 평면에 재현한 뒤샹과 달리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는 3차원 공간 자체를 캔버스로 만들었다.
5. 피카소는 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불을 켰을까

1949년 <라이프>지 사진기자 욘 밀리(Gjon Mili)가 프랑스 남부에 있는 피카소의 집을 찾아왔다. 사진을 찍기 전 밀리는 스케이트 신발에 전등을 달고 빙판을 달리는 피겨 선수 사진을 보여주었다. 순간 번득이는 영감을 받은 피카소는 집 안을 뒤져 손전등을 찾았다. 밀리의 카메라 셔터 막이 열렸다 닫히는 동안 피카소의 재빠른 손놀림은 허공을 누볐다. 빛(photo)으로 그린 두 개의 그림(graphy)이 만났다. 어두운 작업실을 수놓은 불빛이 화려하고 빠르게 명멸했다. 그러나 그 궤적은 영원히 포박당했다.
피카소의 빛 그림 중 하나인 켄타우로스는 반인반마의 괴물로, 초대받은 왕의 결혼식에서 술에 취해 신부를 덮쳤다가 영웅 테세우스에게 쫓겨난 말썽쟁이 난봉꾼이다. 피카소 또한 23살에 처음 만난 유부녀 애인 올리비에부터 72세 때 만난 이혼녀 자클린까지 여성 편력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마성의 정력이 초래한 숱한 비평을 잠재울 만큼 그의 천재성은 빛났다.
한편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피카소를 경쟁 상대로 여겼던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이 빛 대신 물감을 뿌리며 전후 예술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다.
6. 폴록은 왜 캔버스에 물감을 뿌렸을까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우뚝 솟은 미국, 하지만 당대 예술계에선 변방이었다. 전후 뉴욕에서는 피카소가 대세였다. 그의 작품이 융단폭격처럼 쏟아졌고, 잭슨 폴록도 치명상을 입었다. "빌어먹을 피카소! 망할 놈의 피카소!" 에드 해리스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 <폴록>을 보라. 해리스의 놀라운 싱크로율은 외면 연기만이 아니다. 폴록은 절규한다, "제기랄, 피카소! 그놈이 다 해 처먹었어!" 폴록은 그를 저주했다. 평면회화부터 빛의 예술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한 피카소, 폴록에게 새로운 시도는 불가능해 보였다. 도저히 피카소를 넘어설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에 빠져 독한 담배와 술에 절어 지내기도 했다.
어느 날 우연히 붓끝에서 흘러내린 물감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번져가는 광경을 보게 된 폴록, 무언가에 홀린 듯 곧장 캔버스에 물감을 뿌려대기 시작한다. 점도 선도 아닌 부정형의 자국, 더해지고 얽히고설키더니 살아 숨 쉬듯 용트림한다.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다가 아예 부어버린다. 액션 페인팅이 탄생한 순간이다.
밑그림이나 사전 드로잉 없이 캔버스를 누비며 미친 듯 물감을 흩뿌리고 들이붓는 폴록의 액션 페인팅은 뉴욕을 일거에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무명의 알코올 중독 화가였던 폴록은 명예를 거머쥔 스타가 됐다. 그러나 성공의 정점을 지나자마자 그는 허무의 바다로 뛰어내렸다. 신체와 물감의 동시적 움직임을 캔버스에 남긴 채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44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한 것이다.
폴록은 움직임으로 새로운 예술을 만들었고, 20세기 초 미래파는 새로운 움직임을 예술에 담았다.
7. 자코모 발라는 왜 자동차를 찬양했을까

“새로운 아름다움, 바로 속도의 아름다움 때문에 세계가 빛나게 될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는 승리의 여신상, 사모트라케의 니케보다 아름답다.” 미래주의 창시자 마리네티의 선언이다. 1910년 4명의 동료와 함께 <미래주의 화가 선언>을 발표한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도 달리는 자동차의 다이내믹한 연속성을 포착, 그들이 찬양한 세계관을 화면에 구현했다. 이름 그대로 미래파는 과거의 모든 전통과 가치를 부정했다. 대신 새로움과 젊음, 기계와 운동, 힘과 속도를 예찬했다. 그들은 기계 문명의 결과물인,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항공기와 자동차에 매료됐다. 역동적 세계의 한순간이 아니라, 세계의 역동성 그 자체를 화폭에 재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술가만이 움직임에 열광했을까? 미래파에서 테오 얀센까지, 집념의 예술가들이 추구한 움직임의 미학을 100년 동안 구현해온 자동차가 있다. 1913년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로 출발한 BMW. 앤디 워홀, 제프 쿤스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컬래버레이션로 탄생한 BMW 아트카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예술이었다. 항공기 프로펠러를 형상화한 엠블럼, 강한 존재감을 표출하는 키드니 그릴, 우아함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실루엣은 BMW가 품은 다이내믹한 아름다움의 실체다. 수석 디자이너 호이동크(Adrian Van Hooydonk)는 “그저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BMW 브랜드의 모든 것은 바로 달리는 운전자의 즐거움에 있다”고 자부한다. “Sheer Driving Pleasure - 달리는 즐거움”으로 대표되는 BMW Aesthetic 철학을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해보자.
* 이 콘텐츠는 BMW의 지원으로 제작된 네이티브 애드 (Native AD)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