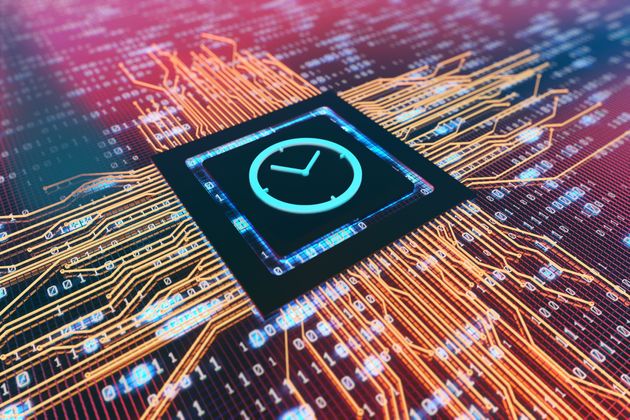

19세기 말, 미국이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는 저서 <제국 평천하의 논리>에서 ‘시간 주권’을 강조한다. 유럽 국가들이 강대국들 한 가운데 놓여 있어 서로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때로는 군사적 충돌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미국은 그 주변부적인 위치의 이점을 얻어 제국의 성장속도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것을 자신의 판단대로 차근차근 도모해 나갈 수 있었다.
난데없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 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평범한 강대국이 제국으로 가는 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시간 주권이란 특정 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다.
즉, 시간 주권을 가진 사회는 공유경제 등과 같이 최근 등장한 새로운 기술 기반의 상품이 도입될 때, 꼭 거쳐야 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새로운 상품이 등장해 특정 사회에 도입되고, 평가가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두루 경험해보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특징들이 하나씩 반영돼 완성품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시간의 주권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외국으로부터 쏟아지는 국제뉴스 소식에 따라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가 겪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에 자주 소개되는 유럽 쪽의 상황은 아무런 맥락없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곤 한다. 최근 한국에 소개된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심에서 에어비앤비를 과도하게 규제한 사례다. 오버투어리즘(수용한계를 뛰어넘어 거주민에 피해를 주는 관광) 탓이라는데 도심지는 에어비앤비보다는 호텔 위주로 숙소가 공급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암스테르담을 찾은 에어비앤비 게스트의 71%는 도심 외곽에 머물렀다. 반면, 암스테르담에는 총 객실 수 7만개에 달하는 약 500개의 호텔이 존재한다. 유럽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호텔업계의 견제가 매우 거세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맥락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공유경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있는 곳, 그리고 한국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지역적 특징을 가진 곳에서의 트렌드를 그 고유의 맥락을 배제한 채 받아 들일 경우 한국 사회는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시간의 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다른 나라와 함께 한국 역시 저성장과 ‘뉴 노멀’ 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자원을 쪼개고 유동화하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등장배경보다는 ‘공유‘라는 단어가 풍기는 느낌에 더 관심을 갖는 듯 하다. 그래서인지 공유경제를 두고 그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개념 ‘착한 경제’라는 정도로만 미뤄 짐작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공유경제에서 자본주의적 특징이 발견될 때 마다 실망하고 비판한다.

공유경제가 왜 등장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다시 말해 ‘시간의 주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새 시스템에 대해 환호하다 보니, 밑바닥부터 다져온 경험이 쌓이지 못했고 논리가 튼실하지 못하다. 그러니 낡은 세력의 저항에 손쉽게 무너지게 되고 작은 비판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
우리 사회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회적 편익 증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 보지도,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논의만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한 의료용 진단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의료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에 따른 ‘빅브라더’ 우려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 역시 미국에서 들려오자 ‘자율주행차 안전성 우려 증폭’ 기사가 등장한다. 미국 사회에서 그 우려가 확대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려면 한참 멀리 가야 할 우리 사회에서 그 ‘우려‘에 대한 논의만 확대 재생산되며 ‘우려’가 꼬리를 물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묵묵히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한국을 찾아와 바둑으로 이세돌 9단을 꺾었을 때 한국사회는 인공지능이 펼쳐내는 디스토피아적 상상을 쏟아내며 일자리 우려에 목청을 높였다. 물론 이런 고민이 쓸 데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논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나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두려움을 과하게 확대해석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쪽으로만 쏠리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아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해보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진짜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우선 한국 사회가 묵묵히 제 갈 길을 걷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먼저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 주권’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사안의 본질부터 하나씩 파고 들고 부정적 효과 외에도 긍정적 효과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차근차근 따지고 경험해 볼 기회가 절실하다.

